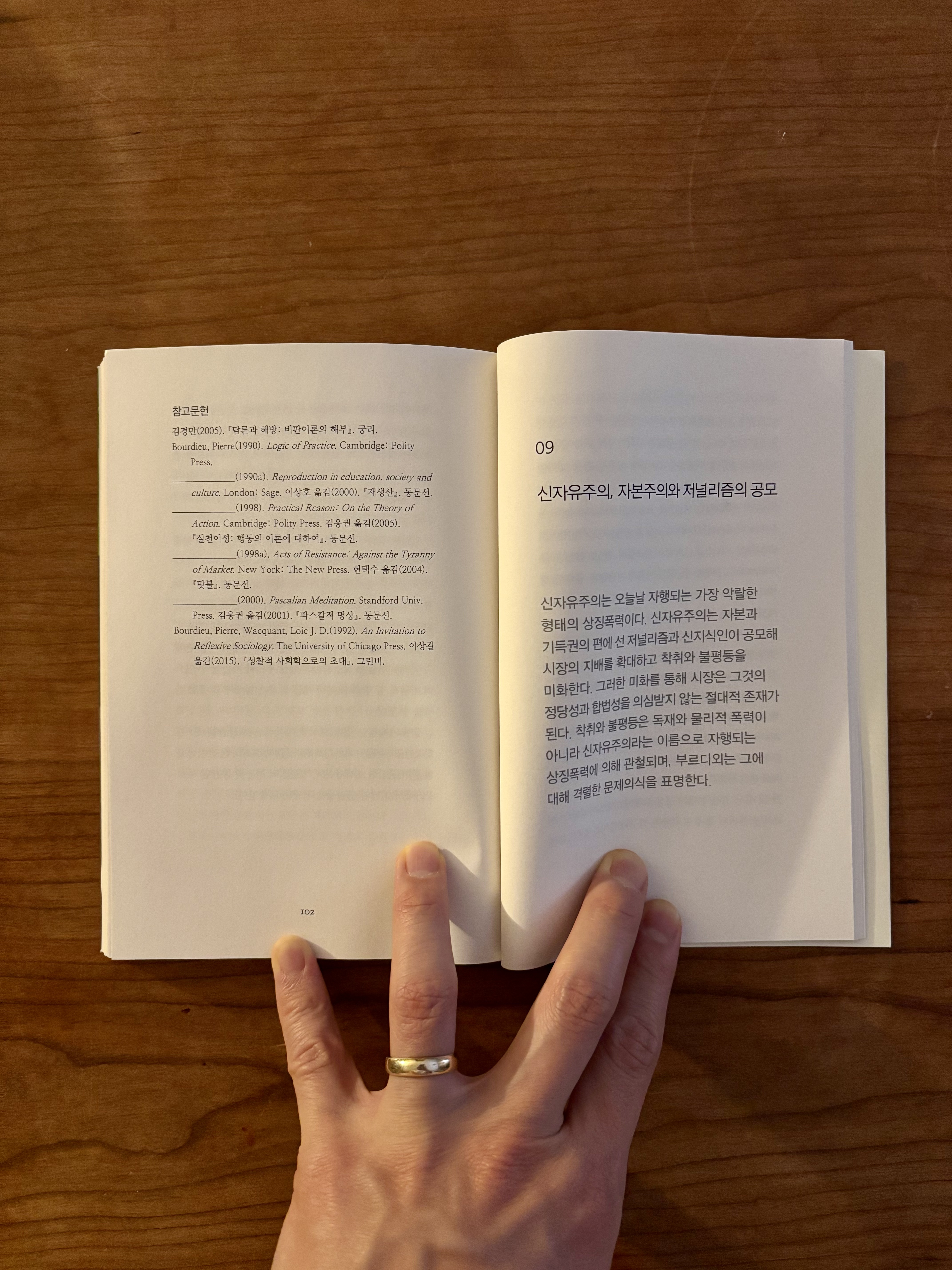
2009년 런던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처음 접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주요 이론들을 정리하고 비평한 책을 읽었다. 10가지 주제를 150페이지 분량의 문고판에 압축적으로 꽉꽉 채워넣느라 띄엄띄엄 설명한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로 생략된 맥락을 추론해내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고, 또 아마도 불어로 정교하게 서술한 부르디외의 원문을 영어로 1차 번역하고, 다시 국문으로 중역하는 과정에서 명료하지 못한 대명사의 활용과 재귀적인 표현의 어색함 때문에 결국 한 달에 걸쳐 두 번 연속으로 읽어야만 했다. 300페이지를 소화한 셈인데 부르디외의 기본적인 관점이 사회공간과 이 곳을 무대로 벌어지는 거의 모든 현상들을 투쟁이라는 비판적인 렌즈를 통해 해석하고 있어서 사람을 굉장히 질리게 만드는 독서였다.
정신적인 피곤함을 잠시 제쳐 두면 사회라는 실체에 대한 그의 분석은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철학 이론을 사유할 때와는 다른 유형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었다. 15년 전 킹스컬리지런던의 어두침침한 대학원생 휴게실에서 눅눅하고 냄새나는 소파에 파묻혀 임박한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구별짓기 이론’을 초조하게 독해했는데 취향이라는 문화 자본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급의 경계를 나누고 그것을 공고화하고, 그렇게 축적한 문화 자본을 다시 경제 자본으로 교묘하게 전환하는 불평등의 구조를 프랑스 지식인 사회 분석을 통해 드러낸 그의 냉철한 시선과 그 간명한 해설의 풍성함에 받은 지적 충격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책에는 그의 사회학 기본 개념인 ‘아비투스’, ‘장’, ‘상징 폭력’, ‘객관화 주체의 객관화’ 등 흥미로운 용어만 봤을 때는 알 것도 같은데 막상 설명을 따라가면 내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이론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부르디외는 궁극적으로 사회(과)학이 지닌 영향력과 객관성을 자연과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원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의 의도가 선하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가 신자유주의에 잠식되었다고 진단한 (이 부분은 나도 깊이 동의한다) 사회의 개혁을 위한 필수 선결 조건으로서 사회학장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사회학이라는 실천의 무오류성과 완전한 자율성을 추구한 것도 납득이 된다만은 사회학 또는 사회학자의 위상을 ‘이 죄 많은 세상 내가 구원해야 한다’는 메시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비사회학자로서의 거북함 내지는 거부감이 들기도 했다.
생각을 글로 옮기고 보니 내가 이런 취향의 책을 본다는 문화 자본의 과시를 통한 구별짓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에 자괴감이 들지만 이 마저도 또 부르디외가 옳았다는 증거가 되는 읽기였고, 그의 이론들을 섭렵했다는 지금의 착각이 2, 3년 정도 후 “이 사람이 거의 반 세기 전에 이런 선지자 다운 주장도 했단말인가? 세상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개탄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촌스럽고 투박한 책은 고이 소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