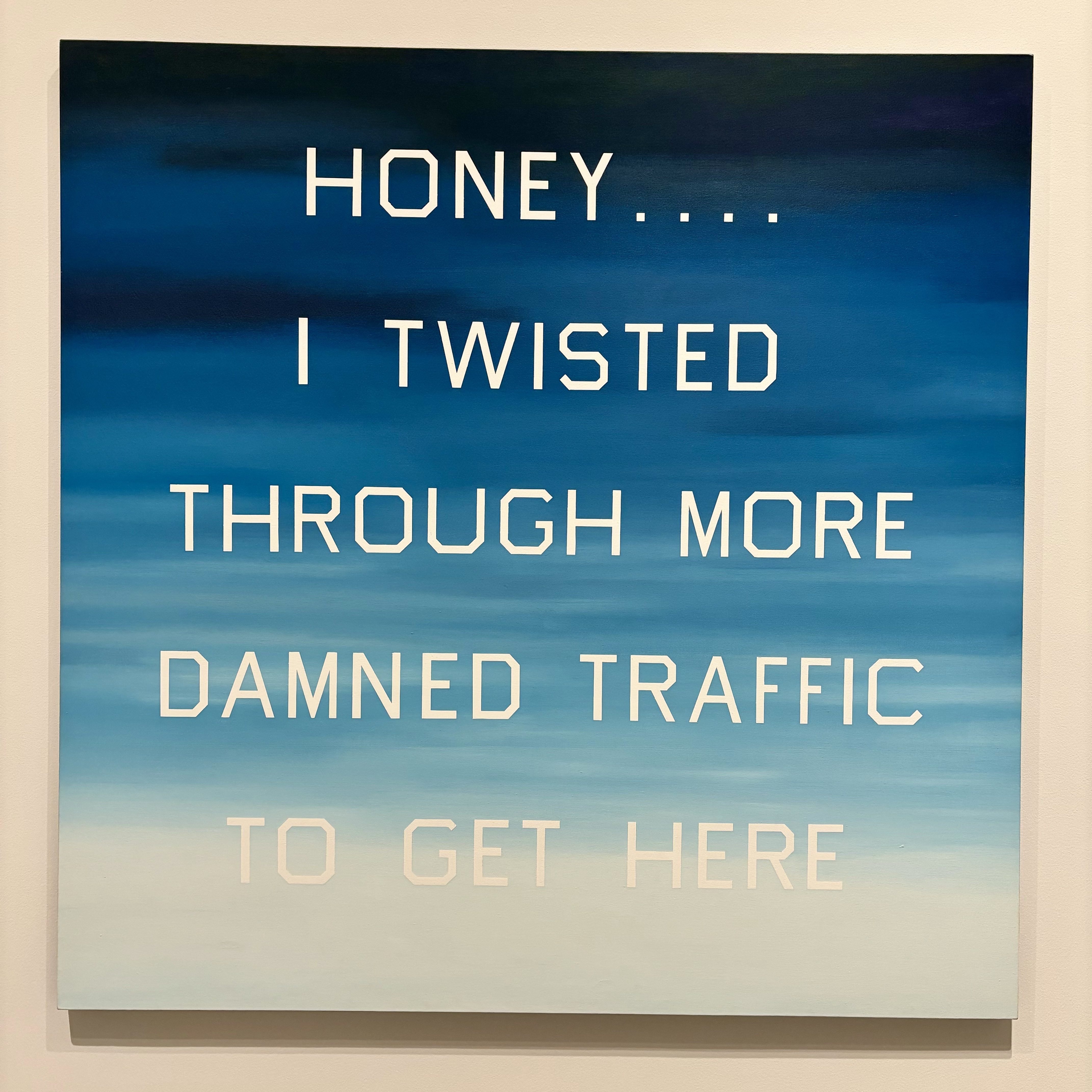
한 회사에 십년을 넘게 다니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들고 남을 겪는다. 지난 금요일은 삼 년 남짓 근무한 모션그래픽 팀 동료 둘의 마지막 출근일이었(나 보)다. 삼십 명 정도의 작은 회사지만 업무상 직접적인 교류가 없는 친구들은 한 달이고 얼굴 볼 일이 없어서 퇴사 소식도 얼마 전에 건너 들었고,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말았다.
그보다 나는 점심 시간에 연희동에 새로 생긴 노트 전문점에 구경가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고, 사러가에서 와인과 베이컨을 골라 오려던 참이었다. 퇴사 예정자들과 몇몇의 동료들을 마주친 건 나의 런치타임 시나리오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고에 가까운 일이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스쳐지나가려는데 무리 중 하나가 느닷없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팀장님, 저희 남북통일 가서 점심 먹으려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남북통일이라면 5, 6년 전 쯤에 가본 만두국 집이 아닌가. 좌식으로 식사하기 불편하고, 음식이 은근히 매콤해서 먹고 나면 속이 거북했던. 거의 반사적으로 나온 대답은 나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나랑 왜 굳이?)맛있게 드세요~”
어정쩡하게 서 있는 다른 직원들의 어색하게 이어지는 웃음소리.
내가 오전부터 세운 알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 내게 불쾌한 경험으로 남은 식당에 대한 연상은 어쩌면 이번 생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압도했던 것이다. 이런 내가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웠는데 나는 내심 내가 정 많고 관계를 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삼년, 말 한 번 제대로 섞지 않고 지내왔는데 유종의미라고 새삼스레 같이 식사를 하는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다가도, 그깟 밥 한 끼가 뭐 대수라고 각박하게 굴었나 자책하며 연희동을 향해 잰걸음을 놓았다.